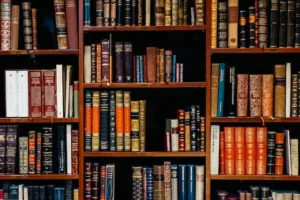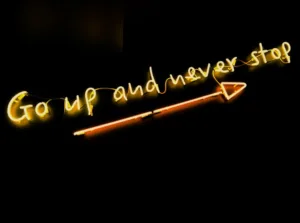Table of Contents
정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정조(正祖)의 진짜 이름
- 정조(正祖)의 이름은 외자
정조(正祖)의 이름은 외자이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임금의 이름은 외자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어휘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임금의 이름을 어휘라고 하는데 어휘와 저촉된 발음을 곧바로 말하지 못했다.
부를 수 없는 발음이 생기면 백성들이 불편해진다. 그래서 임금의 이름은 외자로 지어 그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 정조의 진짜 이름
정조의 성은 이(李), 이름은 성(祘) 이라 발음했다.
그 증거는 옛 기록에 있다.
정조 초기까지 祘을 산이라 읽었으나 정조 20년 8월 11일 규장전운을 전국에 반포 하며 성이라 발음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어휘 “이성”으로 발음되는 관북의 읍명과 호서의 읍명을 변경하였다.
- 정조의 이름 뜻
규장전운에 따르면 祘의 의미는 ”살피다“ 는 뜻이라 했다.
“밝게 살펴서 헤아린다 라는 뜻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민생을 밝게 살펴서 헤아린다” 는 뜻을 담고 있다.
정조의 호
정조는 홍재(弘齋),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홍우일인재 (弘于一人齋) 라는 여러개의 호를 가지고 있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지만 호는 보통 자기 스스로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호를 보면 정조가 추구한 이상과 백성에게 어떠한 임금이 되고자 했는지 알 수 있다.
-
- 홍재(弘齋)
홍재는 정조가 세손 때 동궁의 붙인 이름이다.
논어 태백, 증가의 말에서 따온 이 호는 “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굳세지 않으면 안 되나니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다.,
왕위에 오르기 전 정조의 결의가 담겨있다.
-
- 탕탕평평실(蕩蕩平平室)
정조 14년에 정조가 침실에 붙인 이름이다.
탕탕평평은 서경의 “편벽되지 말고 편당 짓지 않으면, 왕도가 넓고 넓으리라. 편당 짓지 않고 편벽되지 않으면, 왕도가 평탄하고 평탄하리라” 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영조의 대업이기도 했던 탕평은 붕당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인재를 등용하여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정조의 뜻이 담겨 있다.
-
-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
“만 개의 시내에 비친 밝은 달의 주인 늙은이” 라는 뜻으로 정조 22년에 정조가 지은 호이다.
하늘에 달은 하나지만, 땅에 흐르는 시내 만 개에 달이 비치게 되면 달 역시 만 개가 된다.
정조는 자신의 덕화가 만백성에게 고루 미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이 호를 지었다.
-
- 홍우일인재(弘于一人齋)
정조 24년에 정조는 홍우일인재전서 라는 자신의 문집을 간행했다.
홍우일인 이란 “해와 달의 광채가 한 사람에 의하여 널리 퍼진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으로 만천명월주인옹과 그 의미가 비슷하다.
정조의 능호
정조 24년 1800년 6월 28일 아버지 사도세자 곁에 안장되었다.
정조의 능호는 건릉(健陵)이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보고서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는 뜻이다.
정조의 묘호
묘호는 임금이 죽은 뒤 그의 신주를 종묘에 넣고 그 임금에 대해 붙이는 이름 이다.
묘호로는 종(宗)과 조(祖)의 두 가지를 썼는데 조나 종을 쓰는 데는 꼭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조는 나라를 처음 일으킨 왕이나 국통(國統), 즉 나라의 정통이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일으킨 왕에게 쓰고, 종은 왕위를 정통으로 계승한 왕에게 붙였다고 한다.
정조 사후 신하들은 정종(正宗)이라는 묘호를 지어 올렸다.
정조실록에 그 뜻이 나와있다.
“정도로 사람을 복종시킨 것을 정(正) 이라 한다.”
그러나 고종 3년 1899년에 정종이라는 묘호를 정조(正祖)로 바꾸고 선황제로 추존하였다.
정조의 시호
시호와 묘호는 임금의 사후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평가를 담아 지어 올린다.
신하들이 지어 올린 정조의 시호는 문성무열성인장효(文成武烈聖仁莊孝王)이다.
정조실록에 그 뜻이 나와있다.
-
- 문(文) 천하는 경륜하여 잘 다스린 것을 문이라한다.
- 성(成) 예와 악을 밝게 갖춘 것을 성이라 한다.
- 무(武) 천하를 보유하고 공을 세운 것을 무라고 한다.
- 열(烈) 아름다운 덕을 지키고 세업을 따른 것을 열이라 한다.
- 성(聖)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자기 본성을 다한 것을 성이라 한다.
- 인(仁) 인을 베풀고 의를 따른 것을 인이라 한다.
- 장(莊) 올바른 길을 걷고 화평을 지향한 것을 장이라 한다.
- 효(孝) 선왕의 뜻을 계승하여 일을 이룬 것을 효라 한다.
정조는 독서광
정조는 안 본 책이 없는 독서광이었다.
일득록에 보면 정조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과정을 정해 놓고 독서했으며 임금이 된 뒤로로 폐기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조는 “아무리 밤이 깊어도 반드시 촛불을 켜고 책을 가져다 몇 장을 읽어서 일과를 채워야만, 잠자리가 편안해지는”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규장각(奎章閣)
규장각은 정조가 즉위한 직후(1777년) 정식 국가기관이 되었다.
정조는 당시 편당에 몰두하는 조정 신하들의 풍조를 새롭게 하고 국정을 바로 잡아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규장각을 설치했다.
또한 규장각은 왕의 자문 기관으로 유능한 선비를 발탁 임명하여 경사經史를 논하고 정사政事의 자문에 응하게 하였다.
규장각은 크게 4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다.
-
- 역대 왕의 글·글씨·그림, 왕실의 족보 등을 보관하는 기능
- 문신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
-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인 국내외 전적을 수집 ·보관하는 기능
- 서적을 출판하는 기능
일득록(日得錄)
일득록은 신하들의 눈에 비친 정조의 언행이 기록된 책이다.
정조 7년에 규장각 신하의 건의로 시작되었는데 규장각 신하들이 평소 보고 들었던 것을 기록해 두었다가 그 기록을 모아서 편집하여 규장각에 보관하였다.
정조는 이 기록을 “반성의 자료”로 삼기 위해 책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일득록에 비친 정조의 모습
내가 본 일득록에 나타난 정조의 모습은 “반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일득록을 일고 난 후 나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뛰어난 왕이 있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뿌듯해졌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신하들이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